
- 건강검진 받은 일반인 흉부 x선 100,525장 활용- 폐암 진단 확률 대폭 높이고, 조기 진단도 기대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흉부X선 진단시스템이 또 다시 성능을 입증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창민 교수팀(이종혁·선혜영)은 2008-2012년 건강검진을 받은 50,070명의 흉부X선 사진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 결과를 10월 19일 발표했다. 그림 1. 건강검진으로 촬영 한 흉부X선 사진. 우측 폐 상부에 폐암이 의심 되는 음영이 있고 (좌), 이는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상에서도 폐암이 의심됨 (가운데).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 병변의 존재와 위치를 식별하여 폐암으로 판정함 (우). 수집된 자료는 총 100,576장이며 실제 폐암은 98장이었다. 이 중, 흉부 X선만으로는 폐암인지 확인이 어려운 51장을 제외한 뒤, 진단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 진단시스템은 약 97%의 진단정확도를 보이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또한 약 83%의 우수한 민감도를 보였다. 민감도는 검사법이나 예측도구의 성능을 잘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폐암에선 100%의 민감도를 보였다. 표 1. 연구결과 요약표 실제 폐암

고려대 천홍구 교수팀 연구결과DNA 1g에 수백 PB(1015 Byte)데이터 수백만 년간 저장 가능디지털데이터 저장매체로는 급증하는 데이터수요 감당 못 해, DNA 메모리로 해결 아래 주소로 연결해서 들리는 익숙한 음악(하단 링크 참조)은 슈퍼마리오 게임의 도입부다. 이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나 플래시메모리가 아닌 DNA에 저장된 것이다. (https://github.com/dwiegand740/Photon_Enzymatic_Synthesis ◄4번째 파일 실행) 1인 방송과 SNS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생성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메모리 수요는 현재 수십 zetta(1021) Byte 수준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약 7천만 zetta Byte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플래시메모리는 1 bit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약 1 pico (10-12) gram이 필요하여, 위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약 1014kg의 실리콘 웨이퍼가 필요하나, 2040년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 추정치는 108kg에 불과하여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는 플래시메모리에 비하여 데이터 집적도는 천 배 높고, 에

고대 안암병원 김병수 교수팀연구중심병원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작 원스탑 체계 구축 후 연이은 쾌거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세포치료 및 연구 활성화 기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팀이 자체 고유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제작 및 국제 공인받았다. 김병수 교수팀(고려대학교 의과학과 김병수 교수, BK21+사업단 이승진 연구교수)은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를 이용한 자체 고유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발골수종 환자 맞춤 유도만능줄기세포의 국제 줄기세포 등록기관(hPSCreg) 공인을 세계 최초로 받았고 그 결과를 세계 저명 SCI 학술지(Stem Cell Research)에 게재했다. 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hiPSC)는 인간 성체세포에 역분화인자를 도입하여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과정을 거친 미분화상태의 만능줄기세포로, 인체 모든 조직 재생과 세포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러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치료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김병수 교수팀은 십수년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로 역분화 리프로그래밍 효율을 기존

아주대 윤덕용 교수팀14,000 여 명의 활동량 데이터 활용 / 기존 대체법 기술들보다 약 15% 향상된 성능 보여 웨어러블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활동량 데이터 즉, 신체에 착용한 기기를 통해 사람의 활동 강도를 측정한 데이터를 유실했을 때, 이를 복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 활동량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대체법은 이번 연구가 첫 시도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 워치, 피트니스 밴드 등을 통해 건강 상태와 활동·운동량을 측정하는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연구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아주대의료원 의료정보학과 윤덕용 교수팀은 미국 국민건강영향조사(NHANES) 12,475명, 한국 국민건강영향조사(KNHANES) 1,768명 그리고 아주대 바이오뱅크 177명 등 약 14,000명의 활동량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유실된 활동량 데이터를 맥락에 맞게 복원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대체법은 딥러닝 기술 중 오토인코더라는 기술을 활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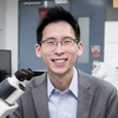
전기/바이러스 이용없이 다양한 유전자 조작물질 세포내 전달 가능세포치료 연구분야 실질적 기여 기대고대 정아람 교수팀 논문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바이오의공학부 정아람 교수 연구팀이 줄기세포나 면역세포의 유전자 편집 및 조작을 위한 미세유체 칩(Microfluidic chip)을 개발했다. 해당 연구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 ‘ACS Nano(IF:14.5)’에 현지시간 10월 9일자 온라인 게재됐다. 줄기세포 또는 면역세포와 같은 일차 세포(primary cell)는 일반 세포주(cell line)와 달리 수명이 제한적이며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 세포의 유전자 편집은 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형질전환 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암 면역치료(cancer immunotherapy)는 최근 혈액암과 같은 난치암 완치에 성공했는데, 이를 상용화하고 다른 고형암 치료의 적용을 위해 대량의 면역세포의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정아람 교수팀이 개발한 미세유체 세포내 물질전달 플랫폼은 기존의 기술들과는 다르게 전기 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고 미세유체 채널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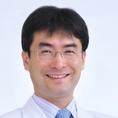
- 서울대병원 연구팀, 영유아 3만여 명 대규모 조사 - 항생제 종류 수·사용기간·투여시기 따라 비만 위험 높아져 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는 항생제 투여에 신중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박영준, 장주영)은 2008-2012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31,733명을 관찰한 연구결과를 10월 14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생후 24개월 이내 항생제 투여가 소아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소아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 대사 증후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아기 비만인구 3명 중 1명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 체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별한 예방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투여한 항생제 종류 수, 사용 기간, 최초 투여 나이가 소아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투여한 항생제 종류가 많을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았다. 항생제를 5가지 계열 이상 사용한 경우, 1가지만 투여했을 때보다 비만 가능성이 약 42% 높았다. 또한 항생제를 투여한 기간이 길수록 소아비만 위험이 높았다. 180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30일 이내로 항생제를 사용한 것보다 비만 위험이 40% 높았다. 최초 항생제 투여 시기도

이중대립형 SLC26A4 변이 환자에서 청력변동의 크기, 빈도 모두 감소해 선천성 유전성 난청 환자(SLC26A4 변이, 펜드레드증후군)에서 반복되는 임상적 특징인 급성 청력악화와 호전을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그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 전 많은 양의 약물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 시기를 조절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정진세 교수와 나지나 강사 연구팀은 SCL26A4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성 난청 환자에서 발견되는 반복적인 청력악화와 호전 증상을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그 빈도와 크기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이비인후과 학술지(audiology&neurot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유전성 난청은 선천성 난청의 50%를 차지한다. 그중 SLC26A4 유전자 변이는 GJB2 유전자와 더불어 아시아인의 유전성 난청 중 가장 흔한 원인이다. SLC26A4 변이로 인한 유전성 난청 환자에서는 경미한 두부 타박상, 스트레스, 상기도 감염 등으로 유발되는 청력의 급성악화와 호전이 반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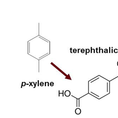
최정규 교수팀, 메조(meso)기공 도입을 통한 계층구조 형태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최정규 교수팀의 홍성원 박사와 정양환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주도로 메조(meso)기공 도입을 통해 스위스 치즈 형태의 계층구조를 가지는 제올라이트 분리막을 개발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제올라이트 분리막은 열역학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xylene 이성질체 등의 혼합물 분리에 탁월한 분리능력을 지니고 있다. 정유·석유화학 산업은 부정할 수 없는 현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 및 기초화합물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플라스틱, 비료, 의약, 포장, 섬유 등)은 일상생활 어디에나 존재하는 대표적 생활밀착형 산업이다. 비록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성 등의 이유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당장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일상 속의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는 없기에, 기존의 산업 설비